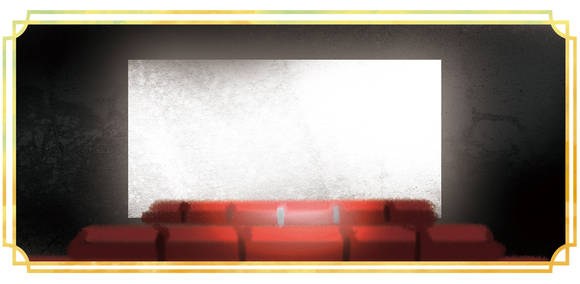
“안녕하십니까? 어떤 영화 관람하시겠습니까?” 내가 이번 여름방학동안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아닐까 싶다. 1학년 때처럼 방학을 마냥 놀면서 보내기 싫었던 나는 영화관 아르바이트에 처음 도전해보았다.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듣는 내 첫인상은 ‘차가워 보인다’거나 ‘조용해 보인다’였다. 이런 내가 항상 웃으며 친절하게 고객들을 마주해야하는 알바를 하려고 마음먹었다니 나 스스로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.
알바를 해본 적도, 알바면접을 본 적도 없었던 나는 다른 지원자들의 자신감 넘치는 자기소개에 주눅이 들었다. 심지어 규정상 염색조차 허용이 되질 않았는데 나는 그 당시 염색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주 밝고 튀는 갈색머리였다. 점점 합격과는 멀어져가는 느낌이 들었고 ‘알바조차도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없는 일인 건가?’하는 자책을 하며 영화관 측에서 선물로 준 영화 관람권 한 장에 위로를 받으며 쓸쓸히 면접장을 나섰던 기억이 난다. 그러나 내 예상과 달리 합격했다는 연락이 왔고, 나는 내 생에 첫 알바를 하게 되었다.
그저 영화를 보러가는 게 전부였던 나에게 영화관 밖의 일들은 신세계 그 자체였다. 상영관의 음향, 온도 등을 시간마다 체크하고, 무전하는 것이나 영화가 끝난 뒤 상영관을 재빠르게 청소를 한 후 다음 영화를 준비하는 것 등, 단순히 영화를 보러왔었던 관객의 입장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일들을 했다. 내가 관객이었을 때는 영화관 좌석이 늘 깨끗한 이유에 대해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. 나는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것들이 다 누군가가 노력한 결과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 신기했다.
무더운 여름날 뜨거운 열기에 튀겨져 나오는 팝콘들을 퍼담는 일을 쉬지 않고 하며 땀을 뻘뻘 흘리곤 했다. 또 ‘명량’과 같은 대박영화가 스크린에 쉴 새 없이 걸리는 날 근무를 하고 집에 오면 코피가 나기도 했고 나도 모르게 몸에 멍이 들어있었다. 육체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지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“감사합니다. 참 친절하시네요”라고 한마디씩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묘하게 보람차고 기뻤다. 난 내 생에 첫 알바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 존경심과 감사를 많이 느꼈다.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고 있는 ‘우렁 각시’들의 세상에 처음 들어가보았던 경험이 나에게는 참 소중하고 의미 있는 기억으로 남아있다.
김보미(사회대 신문방송 13)


